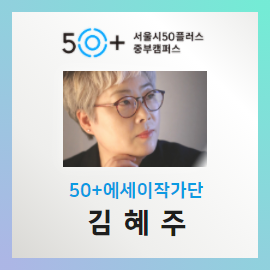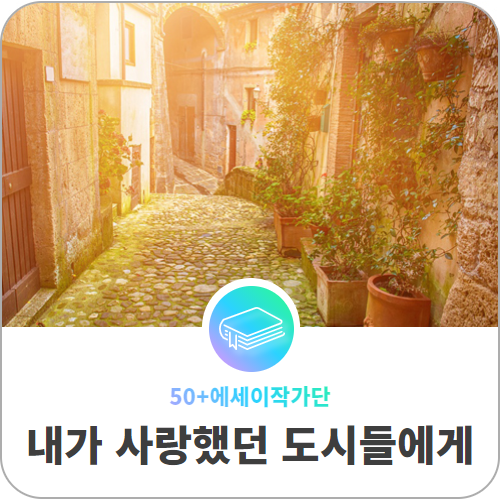
구슬 하나를 오래 간직한 적이 있다. 푸른빛이 좋아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때때로 무료해지면 습관처럼 구슬을 만지작거렸다. 반들반들한 촉감만으로도 왠지 위로가 되었다. 나는 종종 땟국 절은 손바닥에 그것을 꼭 움켜쥔 채 다락방으로 숨어들곤 했다. 얼굴 하나 내밀 수 없을 만큼 비좁은 봉창이었지만, 손바닥을 활짝 펼치면 바람도 지나고 흰 구름이 포르르 모여들기도 했다. 창으로 새어드는 투명한 빛살에 푸른 구슬을 비춰보면 마치 둥근 지구본을 돌려보는 것처럼 세상은 하나의 원으로 이어졌다.

노르웨이 플롬(Flåm)으로 가는 산악기차를 탔다. 해발 866m 뮈르달에서 해발 2m 플롬까지 총 11개 역과 20개의 터널을 지난다. 열차가 지나는 플롬스달렌(Flamsdalen) 계곡은 구불구불하고 험준한 산악지형과 깊은 협곡지대다. 기차는 제 몸을 엿가락 늘이듯 지그재그로 꺾으며 산허리를 돌고 돌아 아랫마을로 향한다. 창밖으로 한 발만 내딛으면 가파른 벼랑으로 떨어질 것만 같고, 올려다보면 눈부신 만년설을 모자처럼 눌러 쓴 산봉우리들이 완강한 자연의 신비를 펼쳐 보인다. 나는 창가에 매달려 기꺼이 그것들의 포로가 되기로 한다.
두렵지만 다가가고 싶은 욕망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넘나든다. 숨어버리고 싶으면서도 완전하게 숨어버리기 싫은 마음, 그 미묘한 감정을 유리처럼 간단하게 전해주는 물체가 있을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손가락을 튕기자 웅장한 폭포수를 배경으로 한 유리창에 홀로그램처럼 내 모습이 비친다. 사각의 유리창은 안과 밖의 경계를 만들고 허물며 대자연의 숨 막히는 풍광 속으로 나를 이끈다.

기차가 플롬 역에 도착했다. 산 쪽으로 나 있는 플롬 강을 따라 걷다가 작은 다리를 건너니 숙소가 보였다. 그곳은 호스텔뿐만 아니라 캠핑장까지 갖추고 있었다. 마치 ‘색종이를 접어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건물들은 초원 위에 알록달록 앙증맞게 서 있었다. 숙소 내부에 들어서자 나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플롬 마을의 경치가 그림 액자처럼 집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사방으로 뚫린 창문마다 푸른 산이 펼쳐지고, 호스텔 앞으로 흐르는 강물소리가 여행자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다.
플롬 강이 나를 밖으로 이끌었다. 지도 한 장을 들고 강을 따라 브레케포센(BrekkeFossen)까지 트래킹을 나섰다. 숙소 리셉션에서 브레케포센이 플롬에서 가장 운치 좋은 폭포라며 추천받았다. 강은 넓은 수로를 만들며 흘러가고 있었고, 자갈돌을 간지럽히는 물소리가 생기발랄하여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다. 한적한 길에는 온갖 야생화가 피어 있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이 충분했다. 몇 번을 주춤대며 지도를 살피다가 산으로 오르는 길을 놓쳤다. 다시 돌아오니 투박한 나무로 만든 이정표가 방향을 가리키고 서 있었다. 흙과 거친 돌로 이어지는 오솔길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파르게 이어졌다. 태초의 생존 흔적이랄까. 무엇하나 인공적인 부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숨이 턱에 찰 즈음에 길섶에서 풀을 뜯는 양떼들을 만났다. “이 높은 곳까지 어떻게 올라왔니?” 인사를 건넸더니 오히려 녀석들이 구슬 같은 눈망울을 굴리며 “이쯤이야. 식은 죽 먹기야!” 라며 내게 장난을 걸어왔다. 사람을 보고도 놀라지 않는 순한 눈빛이 오래 마음에 남았다.
시선을 조금 위로 돌렸더니 거대한 물줄기의 시작으로 보이는 높은 절벽이 눈에 들어왔다. 마치 이 신비로운 대자연의 비밀을 감추려는 듯이 쉴 새 없이 물안개를 만들어 내는 그 깊숙한 곳으로 어쩐지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폭포가 있는 곳에 다다랐다. 숨어 있던 브레케포센은 흘린 땀을 바로 식힐 만큼의 물보라를 일으켰다. 물보라 너머로 수줍듯 무지개가 피어올랐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이곳의 백미는 플롬 마을 전경을 한 눈에 바라보는 것이었다.

산정에서 눈 녹은 물이 폭포가 되어 바다로 이어진다. 온 몸이 깨지도록 떨어져 내린 물과 저 홀로 흘러온 물이 만나 먼 길을 떠난다. 저 멀리 송네 피오르드가 푸른 구슬처럼 반짝인다. 나는 그제야 알아차린다. 투명한 밤이 사물의 경계를 허물 듯, 생은 그렇게 멀리 갔다가도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부우우우.
항구를 출발하는 여객선의 뱃고동 소리를 들으며 나는 천천히 산을 내려온다.
50+에세이작가단 김혜주(dadada-boo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