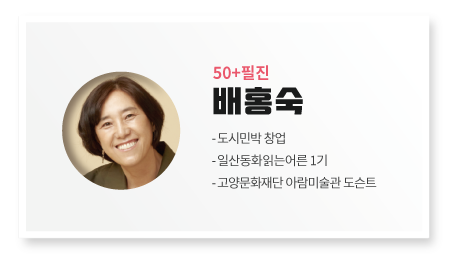<우당탕탕, 할머니 귀가 커졌어요 –엘리자베트 슈티메르트 글/ 카롤리네 케르 그림/ 유혜자 옮김->
<새 친구가 이사왔어요 –레아 골드버그 글/슈무엘 카츠 그림/ 박미영 옮김->
내가 ‘50 플러스 캠퍼스’에서 이번 가을 학기에 수강하고 있는 과목은 서부캠퍼스 인생재설계학부의 ‘50+공동체주거’이다.
11년 전, 언젠가는 아파트가 아닌, 내가 꿈꾸는 집을 짓고 살아보고 싶다는 소망 때문에 땅을 샀고 그곳에 농사를 지으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남들은 쉽게도 하는 거 같아보였는데, 때는 된 거 같은데, 생각처럼 집짓는 일이 쉽지 않았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맘에 맞는 건축가를 만나 설계도 하고 건축허가도 받았건만 또 다른 난제가 생겨서 수도 인입공사만 해 놓고 진행을 멈춘 상태이다.
처음부터 단독 집을 원했던 게 아니고 누군가와 어울려 살면서 작은 텃밭농사도 하고, 재미난 일들을 모색하며 살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사랑방 공간도 설계에 반영했고, <노후를 위한 집과 마을> <나는 어떤 집에 살아야 행복할까?> 같은 책들도 읽으며 건축박람회도 부지런히 다녔는데.......
어쨌든 마음먹었다고 뭐든 술술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할 수 없는 일도 있는 거겠지만 그래도 애는 써봐야겠다는 맘으로 ‘공동체주거’를 등록한 거다. 혹시라도 나랑 이웃할 분들을 그곳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공동체주거’ 수업에서는 해외와 우리나라의 공동체주거에 대한 필요성과 어려움에 대한 강의를 듣기도 하고, 서로가 꿈꾸는 주거와 삶을 나누기도 하고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현장 탐방과 주민들과의 대화 시간을 갖기도 한다.
나는 강사님들이 추천해주는 책을 새로 사기도 했는데, 그 책들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탐방에서 느꼈던 것과 오래 전에 읽었던 그림책 두 권에 녹아있는 철학과 다르지 않다.

<우당탕탕, 할머니 귀가 커졌어요 –엘리자베트 슈티메르트 글/ 카롤리네 케르 그림/ 유혜자 옮김->
이 그림책은 독일의 그림책이다.
아래층에 사는 할머니가 위층에 새로 이사 온 식구들에게 소음 때문에 잔소리를 하도 해서 이사 온 아이들은 넓어진 집에서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웃음소리도 멈추고 스스로 생쥐가 된 것처럼 행동한다.

할머니는 소리가 사라지자 자기 귀를 의심하면서 안 들리는 위층의 소음을 억지로 들으려고 애쓰다가 귀가 엄청 커지는 병에 걸리고 만다. 왕진 온 의사는 할머니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위층 가족에게 협조를 구하는 편지를 쓴다.
그래서 편지를 읽은 위층 아이들이 다시 아이들답게 놀게 되자, 할머니 귀에 소음이 다시 들리게 되고 ‘못들어서생기는병’은 스스로 깨끗이 사라진다.

<새 친구가 이사왔어요 –레아 골드버그 글/슈무엘 카츠 그림/ 박미영 옮김->
유태동화 세 편이 실린 그림책인데 그 중 하나가 이 이야기이다.
1층엔 암탉이 살고, 2층엔 뻐꾸기, 3층엔 고양이, 4층엔 다람쥐, 5층엔 생쥐가 사는 집에서 어느 날 생쥐가 말도 없이 떠나버리자 닭과 뻐꾸기, 고양이, 다람쥐가 새 이웃을 찾는 알림판을 붙여 놓는다.

처음에 온 개미는 방도 부엌도 맘에 든다고 하면서도 게으른 암탉과 이웃하고 싶지 않다며 가버린다. 토끼는 아이들을 남의 집에서 키우는 뻐꾸기가 싫어서 이사 오는 걸 거부하고, 돼지는 고양이의 피부색을 탓하며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한다. 꾀꼬리는 다람쥐 호두 까는 소리가 듣기 싫다고 그냥 가버린다.
비둘기도 알림판을 보고 찾아와 집안을 살펴보는데, 방도 좁고 부엌도 좁지만, 암탉의 볏이 아름답고 뻐꾸기는 예쁘고 깔끔한 고양이가 맘에 들고, 열심히 호두를 까는 다람쥐의 모습이 좋아서 이웃이 되고 싶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도 조용하고 아름다운 골짜기에 있는 5층 집에서 좋은 이웃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
아름다운 환경도 중요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설계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웃을 대하고, 서로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위해 노력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처음부터 타고나는 건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하고, 관습이나 자기중심적인 인식을 바꿔나가려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웃들과 더불어 즐거운 공동체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작년 9월에 10년 동안 전세로 살았던 소박한 마을을 떠나 다시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전망도 좋고 편리하기는 하지만, 50cm 미만의 거리에 있는 위집과 아랫집 사람들은 얼굴도 모른다.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고 그나마 이름도 모르는 채,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그저 몇 호에 사는 사람이겠거니 하며 지내고 있다. 어쩌면, 이곳에서도 서로에게 다정한 이웃이 되어 같은 활동을 하며 재미있게 살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 과정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 공동체주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 모이라고 알림판이라도 만들어야 하나?
나는 이미 많은 친구들이 있고, 내가 즐겁고 행복한 모임도 있다. 그럼에도 더 나이 들고 활동반경이 줄어들 때를 생각해보면, 내가 꿈꾸는 이웃과 주거형태, 주거공간을 포기 할 수가 없다.

나는 비둘기처럼 암탉과 뻐꾸기, 고양이, 다람쥐 같은 이웃과 살고 싶다. 위층에 아이들이 뛰어 노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덩달아 즐거워하며 이상한 병에 걸리지 않고 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