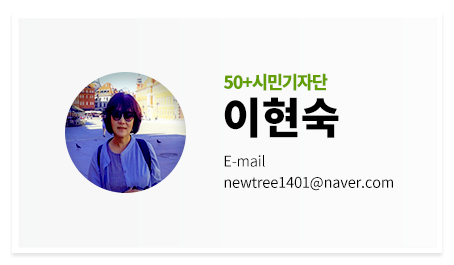내게 다정했던 베를린의 가을이 궁금하다
-
지난 여행의 기억, 브란덴부르크문 지나서 공원 숲 티어가르텐(Tiergarten)

그 공원에 들어선 것은 브란덴부르크문 광장의 햇볕 때문이었다. 애초에 티어가르텐(Tiergarten)에 갈 생각이었는데 시간제한 때문에 거기까지 갈 시간이 있을지 엄두가 안 났었다. 베를린의 랜드마크인 브란덴부르크문은 누구나 가보는 곳, 더구나 어차피 지나는 길이다 보니 일단 먼저 갔다.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서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걷는 방향이 브란덴부르크문이다.
노천카페에 앉아 풍경을 바라보는 이들의 여유로움에 눈길이 간다. 그래, 2차 세계대전과 독일 통일과 같은 격동의 세월을 함께한 건축물일지언정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서 느끼며 즐기면 되는 거지. 가까이 다가가서 들여다보고 심지어 만져보며 무엇을 더 느껴보겠다는 의욕은 없다. 아마 더위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브란덴부르크는 베를린을 포함한 18세기 프로이센 왕국의 중심 근거지였다. 지금은 독일의 북동쪽 주(州) 이름이다. 오랫동안 분단의 상징이었던 문이 오늘날에는 유럽의 단결과 평화를 상징하는 건축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 프로이센을 유럽 강국으로 올려놓은 프리드리히 2세가 제국이 얻은 평화를 기리고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지었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와서 그 뜻을 헤아리고 있는 건가.
그런 의미로, 건축물 부분마다 섬세한 장식과 조각상들을 살피는 재미도 있다. 거대한 문 위에 올라선 여신상, 살아있는 듯 생생하게 묘사된 네 마리의 말들이 여신을 태운 마차를 끄는 모습이다. 각종 신화의 부조나 조각품들을 꼼꼼히 살피고 수없이 사진을 찍어대는 이들을 보며 대충대충 살피기만 하던 나는 얼른 멀찍이 떨어졌다.

초여름 햇볕이 뜨거운 시간이었다. 광장에서 멀리 서서 바라보았다. 다가갈 생각 없이 광장 복판에서 어슬렁거렸다. 무엇을 탐색하듯 연구하듯 들여다본들 우리가 아는 브란덴부르크문 아닌가. 누구나 눈도장 찍는 곳이란 생각에 심드렁하게 바라보며 걷는데 눈에 들어오는 남자, 앗, 옷을 입은 건가? 입었다. 나뭇잎파리로 앞부분만 가리듯 끈으로 손바닥만 한 푸른 천을 매달아 앞부분을 가렸지만 가끔씩 바람에 펄럭였다.

도대체 뭐 하자는 거지? 조금 다가가 보니 깃발 같은 표지판에 독일 국기와 함께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의 주소를 적어놓은 게 보인다. 팔로우 수를 늘리려는 건지 아니면 sns에 자신을 띄우라는 건지 뜨거운 태양 아래서 참 애쓴다 싶다. 처음엔 다가가기 주춤거렸지만 조금 지나니 어서 찍으시오 하는듯한 그를 향해 별것 아닌 듯 마구 셔터를 누르고 있는 나를 본다. 하긴 아주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며 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여자들도 있는데 뭘.
냉전의 시기에 동서 베를린의 경계로 나뉘게 된 브란덴부르크 문은 구경꾼들로 북적이던 번잡한 곳으로 남을 뻔했지만 웃기게도 저런 남자 하나 본 것이다. 그냥 쓰윽 돌아보기만 하고 나오려던 내게 한참 시간이 지금껏 브란덴부르크 문을 쉽게 연상하고 즐거이 떠올리는 건 그 남자 덕분이 아닐지.

그랬음에도 뜨거운 햇볕 때문인지 지쳤다. 생각해 두었던 티어가르텐(Tiergarten) 가자고 했더니 자기 나름의 생각해둔 일정이 있는 여행 동지 남편은 내키지 않는 눈치다.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어디 한두 번인가. 더위에 서로 그리 유쾌한 기분도 아니었다. 그래도 그냥 공원에 가고 싶다고 물러서지 않고 우겼더니 할 수 없는지 그가 앞장선다. 나는 길치니까.
조금 걸어 티어가르텐에 거의 다 왔다고 생각되는데 어느 쪽일까 두리번거렸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티어가르텐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눈을 동그랗게 뜬다. "티어가르텐? 지금 이 땅이 티어가르텐이다" 하면서 웃는다. 그리고 저쪽으로 들어가 보라고 숲을 가리킨다.

끝을 알 수 없는 숲길, 거길 느릿느릿 휴식처럼 걸었다. 숲 내음을 맡으며 걸어 들어갈수록 시간의 축적이 그 숲에 가득하다. 여기저기 수많은 물줄기가 흐르고 댐의 운하를 따라 배를 타고 놀기도 한다. 호숫가에는 여러 척의 조각배가 줄 서 있고 비치베드가 나란히 있었다. 자연친화적인 공원 숲을 누리며 노는 사람들, 파란 하늘 아래 누운 이쁜 연인들이 숲과 어우러진다. 드넓은 초원 위에 야외 뮤지엄과 박물관도 있어서 공원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은 끝없이 많다. 숲길을 밟는 땅은 부드러웠고 브란덴부르크 광장의 땡볕에서 참을 수 없었던 짜증이 서늘한 숲에서 저절로 날아갔다.
티어가르텐이라는 이름을 보며 처음엔 공원 이름에 ‘눈물’이라는 감성적 단어가 쓰여서 한 번 더 마음이 갔다. 알고 보니 티어가르텐은 '동물 정원'이란 뜻이었다. 정식 명칭은 ‘Großer Tiergarten’이다. 프로이센 왕국의 사냥터였던 장소답게 공원이라기보다는 그저 끝없는 숲인 듯하다. 걸으면서 이따금 여기가 어딘가 하며 길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광대하다.(약 220헥타르(ha)라고 한다). 세상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 티어가르텐의 깊숙한 곳을 찾아들면 되겠다.

도심의 중심부에 축복처럼 야생적이고 덜 인위적인 거대한 공원이 있다니 이보다 부러운 일이 또 있을까. 이곳뿐 아니라 베를린은 장벽이 있던 곳에 있는 엄청난 크기의 마우이 공원을 비롯해서 일반적인 동네에도 늘 작은 공원들이 있었다. 이른바 ‘숲세권’이란 게 독일인에겐 기본인 듯 느껴졌다.
티어가르텐은 자연보존이 너무 잘 되어있어, 야생동식물들이 뛰어놀고 물속엔 수중생태 물고기가 유영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이다. 무심히 숲에 잠겨 있을 수 있다니 이렇게 좋을 수가. 들르자고 우기길 잘했다. 오래전 뮌헨에 갔을 때도 뮌헨의 영국 정원에도 가야 한다고 내가 우기며 앞장서서 들렀다가 두고두고 기억 속에 남았던 공원의 추억이 있다. 내게 공원은 언제나 옳다.

생각지 못했던 것이 주는 우연한 색감, 방향, 바람, 햇살, 맛 그리고 친절함...의 기쁨은 크다. 체크포인트 찰리 검문소를 떠올리면 거기 가는 길의 즐거웠던 버스킹이 먼저 떠오른다. 그리고 그 앞의 카페에서 마신 시원한 키위 스무디 초록 색감도 생각난다. 동물원 가는 길에도 온통 노란 손잡이의 버스가 먼저 떠오른다. 베를린 천사의 시를 생각나게 하는 전승기념탑은 아주 높은 67m여서 베를린시 어디서든 잘 보인다. 가까이 다가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라보는 장소는 각기 취향에 따라 다르다. 티어가르텐의 긴 도로를 따라가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탑이 멋지다.
여행지는 어느 장소든 내 마음을 움직인 것이 먼저 떠오르고 오래도록 기억하게 된다. 브란덴부르크문의 그 남자, 그리고 그날의 여행은 온통 티어가르텐만 생각난다. 따분할 뻔했던 날이었는데 티어가르텐이 내겐 득템의 하루를 만들어 주었다.

짧았던 베를린 여행. 물론 잠깐이어서 아쉬움은 있다. 한 달 살기도 부족해서 이젠 1년 살기도 하는 곳인데 어찌 단 며칠로 베를린 여행했다고 할 수 있겠는지. 그저 가볍게 이 도시의 바람과 햇살 속에 잠겨 있다가 간다는 생각으로 베를린의 기억을 마음속에 두었다. 잠깐이어도 괜찮다. 그럼에도 하고 싶은 말은 많고 떠오르는 풍경은 끝이 없다. 기억 속에 담아두고 가끔씩 비타민처럼 꺼내 볼 시간들이다.
베를린은 다정했다. 복잡다단한 역사의 무게를 가지고 있지만 날마다 자연스럽게 거듭나는 모습이다. 그리고 덜 도시스러워서 낯설지 않다. 길을 걷다가 서서 먹었던 커리부어스트와 쫄깃한 독일빵, 거품부터 마시던 쌉싸래한 맥주의 맛이 떠오른다. 가을이다. 베를린의 가을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