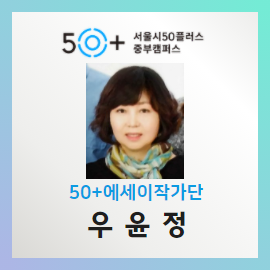자고로, 나이가 들수록 입을 닫고 지갑을 열라 했다. 맞는 말이다.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 그러니까 입 닫고 지갑 열어야 할 나이가 아니었을 때, 그것이 진리임을 깨달았다. 세상이 학교라더니, 세상에 많고 많은 반면교사를 통해서였다. 늘 자신이 분위기를 주도해야 했고 굳이 나서지 않으려는 사람까지 잘 어울리지 못한다며 다 안다는 듯 오지랖을 부려 분위기 망치는 인간을 너무 많이 봤다. 시간이 지나면 대개 그런 사람들이 소외의 대상으로 전락하더라.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했다.
이제 입 닫고 지갑을 열어야 할 나이가 되었다. 다행히 나는 지갑을 여는 데 인색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어쩌나, 입이 안 닫힌다. 고백하자면, 수다쟁이다. 십중팔구 어디선가, 누군가, 날 반면교사 삼고 있을 것이다. 물론 시도 때도 없이 입을 여는 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건 내 입장인 거고 모를 일이다.

아무려나 어제의 만남도 그랬다. 우린 1시에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만났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와 바닥에 떨궈진 낡은 이파리들이 가을이 깊어지고 있음을 알렸다. 잠깐 이곳에서 서성였던 젊은 날을 추억하던 우리는 자연스럽게 밥집으로 향했다.
한참 만에 만났지만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다. 프리랜서가 되면서 알게 됐으니 15년도 더 오래 안 사이.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만나 공연이나 전시를 보고, 맛있는 집 찾아가고, 차 마시며 수다 떠는, 몇 안 되는 후배 중 한 명이었다. 나보다 열두어 살 밑이지만 친구 같기도, 친동생 같기도, 때로는 언니 같기도 한 후배였다.
밥집까지 걸어가면서부터 우리의 입은 멈추지 않았다. 밥을 먹으면서도, 밥을 다 먹고 애써 찾아간 찻집에 자리가 없어 다시 걸을 때도 우리는 내내 종알거렸다. 작고 귀여운 카페를 발견하고 들어서면서 우리의 수다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영화로 치면 예고편에 이은 본편이라고나 할까.
날이 좋았다. 이즈음의 날처럼 쨍하게 푸르른 가을날은 아니었다. 햇볕이 너무 따갑지도, 바람이 너무 서늘하지도 않은, 그래서 걷기에 썩 좋은 날. 우린 다시 걸었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골목을 오래 걸었다. 구절초와 개미취 꽃이 핀 야외 테라스 카페에서 한 잔의 차를 더 마시고 우리는 헤어졌다. 오후 1시에 만나 5시 반까지, 대략 4시간 반 동안 잠시의 정적도 허락하지 않던 우리는, 마침내 입을 닫았다.

그 시간 동안 참으로 많은 얘기를 했다. 대부분이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오늘의 이야기였다. 둘 다 낳은 적, 키운 적 없는 아이에 대해서도 오갔다. 나도 그렇지만 기혼의 후배 역시 진작에 출산과 육아를 포기했는데, 이유는 같았다. 내 욕망과 내 저열함과 내 비루함과 닮지 않았으면 좋겠는 유전자를 이 세상에 내놓고 싶지 않다는 건, 진담 반 농담 반이었다. 아이를 낳는다는 건 한 세계를 책임지는 것인데 그럴 자신이 없었다는 이유도 누군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는가 싶었다. 사실은 너무 애쓰고 살고 싶지 않았다. 성향으로 볼 때 애를 위해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그 무한 반복을 감수할 텐데, 이미 인내의 총량을 다 써버렸다는 것.
거절하지 못하고 뒤로 후회하는 내 습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나는 거절을 잘 못 한다. 그 일을 맡으면 고생하리라는 것을 빤히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한다. 그래놓고 후회한다. 일단 하기로 했으면 군말 없이 해야 하는데, 하는 내내 내가 미쳤지, 괜히 한다 했어, 구시렁댄다. 참 못났다. 급한 원고라며 도와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끝내 거절하지 못해 일주일 내내 밤샘작업을 하다 결국 입술에 포진을 달고 나온 나를 두고 후배가 하는 말,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듯이 거절도 해본 놈이 잘 하는 법이라네. 그런 말 들어 싸다.
그간 읽었던 책들도 서로 추천한다. 이날 우리 입에 언급된 책은 팩트풀니스,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 멋있으면 다 언니, 우리 사이엔 오해가 있다, 정도.
오늘 우리가 빠져있는 것으로부터 잠시 스치는 단상들에 이르기까지 주제는 대중없다. 싱거운 농담이야 양념일 터다. 야외 카페 돌의자에 앉으며 내 한창 뜨거웠던 젊은 날에는 사내 무르팍 아니면 앉지를 않았다 같은. 잠시의 정적도 없었으니 혹 우리 뒤를 따라온 이가 있었다면 십중팔구 귀에서 피가 났을 것이다.
좋은 계절 좋은 사람과 함께한 수다 삼매경. 그것은 기쁨인 동시에 날 생기 있게 하는 활력소이다. 그러니 내가 이 기쁨을 포기하고 입을 닫을 수 있겠는가 말이다. 다음에 만나거든 대놓고 물어봐야겠다. ‘입을 좀 닫는 게 좋을까? 지갑을 더 많이 열면 괜찮을까?’라고.
50+에세이작가단 우윤정(abaxia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