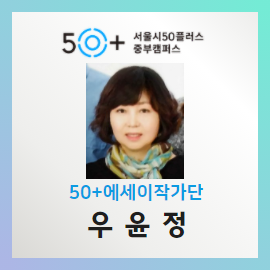11월입니다. 기어코 11월입니다. 비까지 내리네요. 1인 가구로 살아오면서 감상에 빠지는 걸 경계해 왔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격정에 휩싸여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과오 때문일 겁니다. 같은 실수와 후회를 반복했고, 그때마다 후유증이 제법 커 상처를 입었거든요. 언제부터인가 감정이 평균치를 넘어서면 뇌가 먼저 기억하고 차단하더군요. 내상이 깊어지면 치유가 어렵거나, 치유되어도 흉터가 남는다는 것을, 그 흉터가 자칫하면 덧난다는 것을 아는 까닭입니다. 한순간 폭풍우처럼 휘몰아쳐도 곧 바람처럼 물처럼 흘러갈 것을 알기 때문이기도 하고, 과잉된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기도 하고요.
돌아보면, 지금보다 젊고 철이 없을 때는 상처 입는 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때라고 아프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외려 사소한 일에 일희일비하며 세상 다 무너진 듯 절망하던 시절이었는데 말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데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일부러 모진 말로 생채기를 내기도 했습니다. 상처를 주려다 정작 내가 상처를 입기도 했더랬지요. 그때는 몰랐어요, 누군가에게 상처 내는 일이 상처 입는 것 못지않게 스스로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요.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내상이 켜켜이 쌓였을 테지요.

더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감상에 지나치게 젖어 들라치면 방어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도 오늘처럼 11월의 비 내리는 오후, 창 넓은 창가 자리에 홀로 앉아 창밖을 보고 있자니 센티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군요. 이 계절엔 꽃보다 잎에 시선이 머뭅니다. 바람이 흐르는 대로 모였다 흩어지는 바닥의 낙엽들, 나무 끝에 위태로이 매달린 물든 이파리들이 한 떨기 꽃과 같네요. 싱싱하고 화려한 아름다움 대신 처연한 아름다움 같다고나 할까요. 더욱이 오늘이 지나면 이 공간에 글을 연재할 기회가 딱 한 번 남게 됩니다. 그러니 멜랑꼴리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이곳에 글을 연재하기 시작한 때가 5월이었습니다. 한 통의 전화 덕분이었습니다. 에세이 작가단을 모집하고 있으니 지원해 보라며 권유하더군요. 망설이고 주저하는 내게 버나드 쇼의 묘비명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까지 들먹이면서요. 지원서를 냈고, 운 좋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글이 열네 번째 글이 되겠군요.
고백하자면, 늘 마감에 허덕였습니다. 본업에 쫓기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닌데도 말입니다. 미루는 게 습성이 된 탓이었을까요? 1990년대 초 사회 초년생일 때부터 계속해 원고 마감 인생이었다면 핑계가 그럴듯할까요?
마지막 연재 글을 앞두고 뒤늦게 후회가 됩니다. 좀 더 숙고했어야 했다고, 최소한 연재명에 충실한 일관성은 유지했어야 했다고, 내용이 부실하면 부족한 만큼 시간을 들이고 공력을 쏟아야 했다고. 이렇게 반성은 습관이 되고, 후회는 늘 되돌릴 수 없고 말이죠.

사실 ’1인분의 삶, 1인분의 생각‘으로 이름 붙인 건 1인 가구인 데다 1인분 이상의 생각을 말할 만큼 사유가 웅숭깊지 못함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비루한 글일지라도 읽은 이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 내 부족한 1인분의 생각에 누군가의 생각을 덧대어 때로는 2인분, 어쩌면 2인분+α의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행히 11월입니다. 11월은 반성하기에 딱 좋거든요. 시월은 너무 빠르고 12월은 지키지 못할지언정 다가올 새해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서요. 실은 일 년 열두 달 중 11월을 유난히 좋아합니다.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어울린다고나 할까, 그런 점에서 11월은 50~60세대를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출보다 일몰에 가까운. 저물고 있지만, 완전히 진 것은 아닌. 눈부시게 아름답진 않지만 눈물겹게 아름다운. 내게 11월은 그렇습니다. 그런 11월의 정서를 사랑합니다.
이제 집에 갈 시간입니다. 혼자 돌아가는 길목, 새삼스레 다리 휘청이며 가슴마저 아득해집니다. 머잖아 12월이 닥치고 캘린더의 남은 한 장마저 뜯기면 기어이 2022년이 올 테지요. 아직 11월이라 고맙고요. 11월이 다 가기 전에 함박눈이 내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언제나 떨리던 첫사랑처럼 첫눈을 기다립니다.
50+에세이작가단 우윤정(abaxia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