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뽕짝을 듣고 울어요?"
-
가히 트로트 열풍입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이 연이어 나옵니다. 트로트 경연도 여러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트로트가 이렇게 대세가 될 줄 정말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어느 날 문득, 하염없이 흘러나오는 트로트를 듣다가 풋,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주 오래전, 거의 신혼 즈음의 일이 떠올랐어요. 오랜만에 후배 부부와 만나 밥과 술을 먹고 있었죠. 어떤 얘기 끝에 남편이 말했어요.
“아 옛날에, 심수봉 노래 듣다가 눈물 뚝뚝 흘리면 정말 감당이 안 됐지.”
연애 시절 얘기였어요. 아마도 그랬겠죠. 때로, 가끔, 종종 울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꼭 심수봉 노래 때문에 울었을까요? 앞뒤에 뭔가 속상한 일도 있었을 테죠. 때로 남성들은 얼마나 단순한지요-결코 남성폄하가 아님- 시시콜콜 이유를 말하는 것도 유치하다 싶을 땐 결국 노래를 핑계로 울어버리기도 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에게는 몹시 인상 깊은 추억이었던가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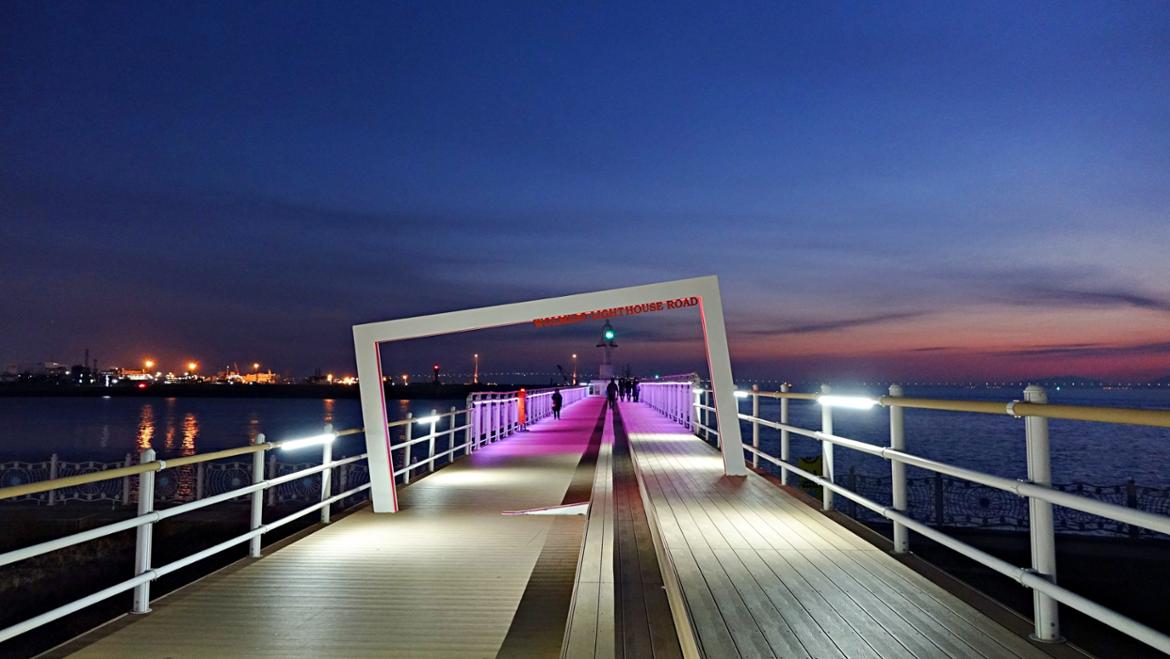
나름대로 아는 이들이었지만 그래도 스멀스멀 민망함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정작 민망한 건 후배 남편의 뒤이은 한마디였습니다.
“뽕짝을 듣고 울어요?”
그는 감정의 미혹 따위 전혀 모르는 말간 눈으로 내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죠. ‘거참 어이없군’ 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니, 뽕짝이라니?’ 마시고 있던 돌배주가 목젖에 컥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뽕짝은 트로트를 무척이나 비하하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사슴 같은 눈망울 껌뻑이며 묻는 그 앞에서 ‘심수봉을 뽕짝이라고 하다니’ 하며 반론을 제기하는 건 어차피 웃기는 일이었어요.

‘그래, 어쩔래. 난 심수봉을 듣고 울었다!’ 속으로만 주절주절 항의했어요. ‘그때 그 사람’부터 ‘사랑밖에 난 몰라’까지, ‘백만 송이 장미’부터 ‘그대는 이방인’까지 심수봉은 말 그대로 심금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광안리 밤바다에선 ‘Ne me quitte pas’를 부르는 자크 브렐의 목소리에 눈시울을 붉혔고, 삼청동 지하 카페에선 헨델의 사라방데에 울었고 아말리아 로드리게스와 아다모와 그밖에 숱한 외국의 유사 트로트에도 울었죠. 이렇게 쓰고 보니 참 많이 울기는 한 것 같습니다. 남편, 참 많이 당황스러웠겠네요.

우리 노래에 ‘한’이 담겨 있는 것처럼 포르투갈의 파두에는 그들의 사우다드가 배어있죠. 심장을 뒤흔드는 슬픔, 바다에 나간 이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끝없는 낮과 밤, 돌아오지 않는 사랑으로 병들어버리는 가슴. 우리 트로트가 쿵짝쿵짝 네 박자에 인생사를 노래하듯이 12줄의 현악기 기타라를 뜯으며 파두는 흐느끼고 탄원하고 항의하고 비난하고 호소합니다. 아말리아 로드리게스가 ‘아아아아아’ 검은 돛배의 후렴을 부를 때 오래전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했던 이슬람의 사라진 정취가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들의 멜리스마 역시 파두를 더 절박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죠. 그 절박함이 마음을 흔든 것처럼 심수봉도 그랬습니다.

고백하건대 심수봉의 ‘뽕짝’은 내게 간절한 시였습니다. 그가 ‘나 당신 사랑해도 될까요’(비나리)라고 노래하거나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져 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백만 송이 장미)라고 노래할 때 그는 이미 숱한 상처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을 꿈꾸는 영혼입니다. 그는 상처 때문에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라‘고 하지 않죠.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를 기어이 피우겠다는, 이젠 모두가 혹 떠날지라도 사랑은 계속되리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 자세가 더 아프고 더 응원하게 했습니다. 상처 속에서도, 그 찢어진 틈으로 새어드는 빛에 다시 상처를 씻고 그 빛에 물들어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보려는 그의 트로트는 어떤 시구에 못지않은 울림을 주곤 했어요. 그런데 뽕짝이라니! 지금 생각해도 그의 표정은 말문을 닫게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트로트의 물결 속에서 “뽕짝을 듣고 울어요?”라고 물었던 그 친구 생각이 납니다. 예전과 달리 트로트가 남녀노소 모두에게 조금은 더 가깝게 다가선 듯한 오늘, 그의 생각도 좀 달라졌을까요? 이런 열풍이 오래전부터 트로트를 불러왔던 세대에 대한 이해를 넓히지 않았을까 기대가 생기기도 합니다. 옛 트로트가 인생사의 쓴맛을 좀 더 노래했다면 요즘은 실시간을 반영하는 경쾌하고 재미있는 노래들도 많더군요. 그래서 그때와는 또 다르긴 하지만, 그토록 말간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던 그 꽃사슴 같던 후배 남편은 아직도 트로트에 마음이 흔들려본 적이 없으려나요? 이제 그 친구도 50세대가 되었을 텐데 아직 확인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글을 쓰면서 이어폰을 꽂고 자크 브렐의 ‘Ne me quitte pas’를 듣습니다. 여전히 ‘If You Go Away’보다 더 간절하고 더 아프네요. 그런 간절함이 또 마음을 젖어옵니다. 느므끼뜨빠....“나를 떠나지 마세요. 당신의 그림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림자의 그림자, 당신의 손의 그림자, 당신의 개의 그림자라도…….” 하지만 모든 것은 떠납니다. 이 안개 같던 한여름도 떠나고 아득한 두려움도 떠나겠죠. 그래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 매여 있을 이유도 없죠. 금세 시월에 접어든 2020년, 코로나19 상황이 오래되다 보니 지치기도 하고 조금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좋은 노래, 좋은 시, 좋은 이야기들은 좋은 친구가 되어줍니다.
때론 눈물 짓더라도 다시 웃으며 하루하루 힘을 내며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트로트든 우리 가락이든 고전음악이든 굳이 경계가 필요하겠어요? 무엇이든 우리에게, 나에게도 당신께도 힘이 되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글·사진 : 50+시민기자단 이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