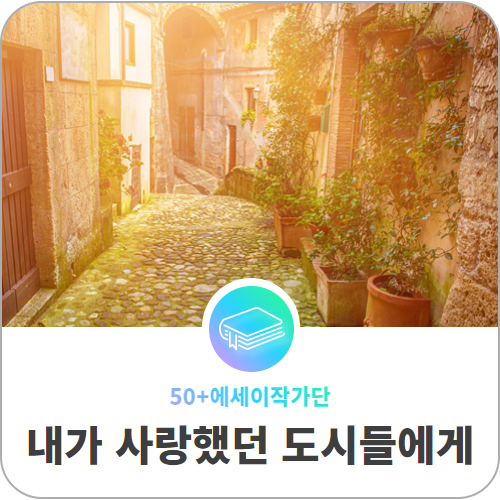
항구도시 보되(Bodø)는 인구 5만 명의 작은 도시다. 걷다보면 웬만한 곳은 모두 걸어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아담하다. 그것에 비해 적막한 북해의 바다가 그려내는 압도적인 자연 경관은 너무 낯설어서 외려 매혹적이다. 여행하는 동안 만났던 피오르드의 까마득한 절벽이 그러하고, 절벽마다 실타래처럼 걸린 폭포 또한 그러하다. 진청색의 맑은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에는 흰 요트와 원색으로 칠한 어선들이 가득 정박하고 있다.

보되(Bodø)는 로포텐 제도(Lofoten Islands)로 들어가는 바닷길의 관문이자, 하늘 길의 입구이기도 하다. 로포텐으로 들어가는 배가 보되 항구에서 출발하고, 비행기가 뜨는 유일한 공항이 이곳에 있다. 세상의 끝은 어디나 그리 아름다운가? 오래전 먼발치에서 바라보았던 해금강 말무리 반도가 북극해에 펼쳐지는듯하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두 곳의 풍경이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섞인다. 마치 환영처럼 기이하다. 그 너머로 한두 마리 바닷새들이 북북서로 방향을 틀어 날아간다.
내가 상상했던 것과 사뭇 분위기가 달랐다. 시끌벅적하지도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다. 한없이 공허하고, 끝없이 스산하고, 기약 없이 적막했다. 부슬부슬 내리던 비 탓이었을까. 집을 떠나온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기억이 아득해졌다. 시내는 그리 크지 않아 보였지만, 바닷가 쪽은 거침없이 열려 있었다. 비를 맞아도 다닐 만하고, 우산을 써도 그럭저럭 걷기에 문제없을 날씨 때문에 우산을 폈다 접기를 반복했다. 그렇게 비오는 바닷가를 싸돌아다닌 것이 화근이었다. 비에 젖은 뒤통수에 고단함이 무섭게 달라붙었다. 바람에 날리는 옷깃을 여미며 나는 서둘러 호텔로 향했다.

에드워드 호퍼「Hotel Room」(1931) (출처_ www.museothyssen.org)
나는 홀로 호텔에 남았다. 체크인을 하면서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다. 낯선 여행객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어지럽게 오갔고 비껴간 시선들은 허공에 맴돌았다. 나는 느릿한 걸음으로 재빨리 객실 문을 열었다. 벽면에 카드를 꽂자 옅은 조명이 켜졌다. 맑은 콧물이 졸졸 흐르고 목이 따끔따끔 아팠다. 여행 가방을 바닥에 밀쳐 둔 채, 털썩 침대에 주저앉았다. 한여름이었는데도 어디선가 찬바람이 부는듯했다. 에드워드 호퍼(Edward Hoppe)의 그림처럼 나는 작은 수첩을 펼쳐들고 무엇을 끄적거렸다. 한기(寒氣)가 몸을 파고들었다. 감기 몸살이었다. 아직 돌아갈 길이 절반이나 남았는데 아파서는 안 될 일이었다.

보되(Bodø) 바다 소용돌이 살트스트라우멘(Saltstraumen)
주전자에 물을 끓이며 나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거나 전화기를 만지작거린다. 컨디션 악화로 오후 일정을 모두 비우고 혼자 노는 중이다. 조용한 방 안에 물 끓는 소리만 요란하다. 툭, 소리가 나면서 전원이 꺼지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컵에 티백(tea bag)을 넣어 뜨거운 물을 붓는다. 차가 우러나는 동안 나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쥔다. 따스한 온기가 전해지며 볼이 발그레해진다. 입김으로 후후, 뜨거운 차를 불어본다. 내가 놓친 보되(Bodø) 바다 소용돌이 살트스트라우멘(Saltstraumen)이 컵 안에서 회오리친다. 나는 뜨겁고 거센 북해의 조류를 홀짝거리며 마신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뜨끈한 무엇이 피곤함을 조금 누그러뜨린다.


빈 도화지처럼 깨끗한 침대에 누워 멍 때리기 한다. 아무 짓도 하지 않는다. 방전된 몸뚱이를 침대에 눕히고 무선 충전중이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까먹는 시간이 오래 이어진다. 여행을 하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다. 분명히 그곳에 있으면서도 ‘내가 있다’는 게 잘 믿기지 않을 때 말이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곳이나, 영화나 소설 속의 공간 속에 실제로 발을 디딜 때 느껴지던 그런 감정이다. 약기운 탓으로 여전히 비몽사몽이다. 정신을 차리려고 용을 써도 몸이 천근만근, 따뜻한 국물을 마시고 싶었고 집이 그립다. 여행 시작할 때의 자신감과 패기만만은 어디로 가고, 기운 하나 없이 호텔방에 납작 누워있다.
아무튼, 그곳에서 안녕하지 못했다. 그런 이유로 나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때로는 안녕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안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50+에세이작가단 김혜주(dadada-boo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