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올렛
봄이면 작고 가녀린 줄기 끝에 다섯 장의 꽃잎을 오밀조밀 매달고 수줍은 듯 피는 꽃이다. 돌 틈이나 양지바른 언덕에 피어나 봄을 가장 먼저 알려주기도 한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고 몸을 낮춰야만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꽃이다. 눈높이를 맞추고 천천히 바라보면 작은 꽃이라 더욱 애틋하고 소중하다. 초록이파리도 조그맣고 보랏빛 꽃잎도 앙증맞다.
작은 아이 ‘오산이’의 탄생으로 시작하는 신경숙 작가의 소설 『바이올렛』은 관습과 제도에 억눌려 자신들의 부당한 운명을 견디다 떠난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다. 할머니, 어머니와 같이 사는 ‘오산이’, 엄마 없이 아버지와 사는 ‘서남애’, 가족을 모두 잃은 ‘이수애’, 소설 속 그녀들은 무언가의 부재 속에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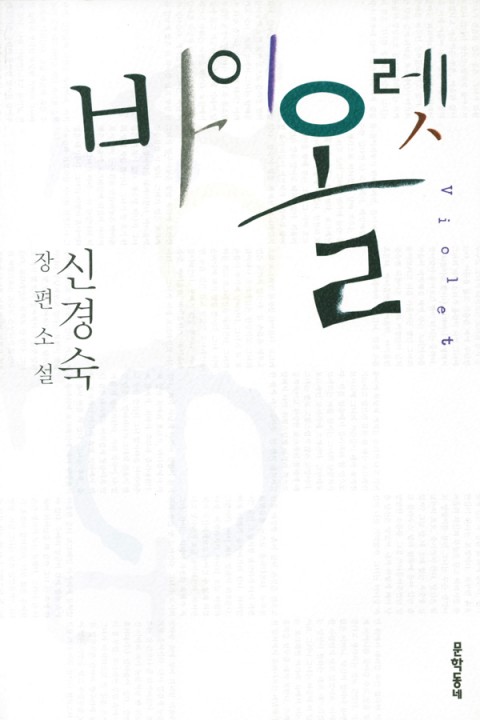
신경숙 『바이올렛』 문학동네 (2001) (사진 출처 : 문학동네)
조그만 여자애
장마비가 후둑이는 칠월의 어느 날, 문이 닫힌 집, 어두운 방안에서 갓 태어나 할머니 손에 들려진 이 여자애를 그녀의 어머니는 보려 하지 않고 눈을 질끈 감아버린다. 이 아이가 태어난 이후 이 집에서 생겨 날 일을 벌써 알고나 있는 듯이. 축복 받지 못한 여자애. 이미 양수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파악한 듯 보드라운 손길 대신 눈을 감아버리는 어머니의 태도를 수납하며 커다랗게 울지도 않는 갓 태어난 여자애. 칠월의 빗소리만이 집 안에 가득하다.
- p. 7

제비꽃
미나리 군락지
끝없이 이어지던 고향 들판 어디쯤, 야생 미나리 군락지를 자주 볼 수 있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짙푸른 미나리는 풀과 함께 섞여 있어 줄기를 잡고 하나씩 꺾어야 했다. 간혹 거머리가 붙어 있어 손에 움켜쥐고 있던 미나리를 도랑에 던져버리고 친구들과 함께 달음박질치다가도 이내 되돌아가 독특한 향을 풍기던 푸른 미나리를 끌어안고 놀곤 했다. 그 시절 우리 어머니 처방전에도 야생미나리는 만병통치약으로 종종 등장했다.
어린 ‘오산이’는 할머니와 어머니가 싸우는 날은 혼자서 푸른 미나리 군락지가 있는 둑으로 가서 해가 설핏 질 때까지 엎드려 있기도 했다. 떠나버린 아버지와 끊임없이 어머니를 헐뜯는 할머니와 번득이는 미용가위를 쥐고 있던 어머니를 떠올렸다. 미나리의 푸른빛이 그녀의 눈 속으로 쓰라리도록 시리게 감겨들었다.

미나리 군락지
이 마을에서 태어나 첫돌을 맞이한 아이들의 돌상에 이 군락지의 미나리는 수명이 길라는 뜻을 품고 길게 데쳐져서 오른다. 그녀의 어머니는 생미나리를 뜯어다 김치에 넣는다. 한번은 그녀가 하교길에 비를 맞아 열에 끓을 때 그녀 어머니는 미나리를 뜯어와 찧은 쓴 물을 그녀에게 마시게 했다. 그걸 본 마을 여자들은 그 후로 아이들이 소화가 안 되거나 머리가 아프다 하면 미나리를 찧어 마시게 한다.
- p. 12
꽃을 돌볼 여종업원 구함
세종문화회관 옆 골목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주인공은 출판사에 전화를 걸지만 안타깝게도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는다. 혹시나 하던 미련이 한꺼번에 무너진 그녀에게 공중전화 부스 맞은편에 있는 화원이 눈에 들어온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화원 안으로 들어간 그녀에게 푸른 물통에 담긴 여름꽃들이 먼저 인사를 건넨다. 도시의 일상적인 공간에 자리한 화원이 느닷없이 자동차 소리를 잊게 해주듯이, 그곳은 주인공 ‘오산이’에게 어릴 적 미나리군락지처럼 푸르고 싱싱한 공간으로 존재한다.
소설이 발표되고 나서도 한동안 화원은 그곳에 있었다. 언제부턴가 커피가게, 패스트푸드점이 생겨나더니 화원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다. 나는 낯선 골목에 서서 화원이 있던 자리를 눈으로 더듬는다. 금방이라도 그녀가 꽃을 안고 나타날 것만 같다.


세종문화회관 패스트푸드점이 들어와 있는 예전 화원 자리
방금, 화원 여종업원이 된 그녀, 물줄기가 흐르는 호스를 화원 바닥에 대고 물을 뿌린다. 소철, 벤자민 고무나무들이 화원 안쪽 좁다란 통로에까지 가득하다. 아침까지만 해도 우울했던 마음이 화원 바닥 물청소를 하는 사이 개운해진다.
- p. 41
기다란 이층 방에서 화원까지
‘오산이’는 날마다 삼청동 은행나무가 있는 기다란 방에서 세종문화회관 근처 화원까지 걸어서 출근한다. 그녀는 교보문고, 광화문, 현대미술관, 한국일보 빌딩을 지나며 걷는다. 그곳 지리에 밝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 풍경을 이어볼 수 있다. 그녀가 그리는 동선이 너무나 사실적이고 선명해서 소설을 읽다 보면 오히려 모든 공간이 낯설어 보이는 기이한 체험을 하게 된다.
잡지 표지 사진을 찍으러 화원에 온 남자는 그녀가 건네는 바이올렛 화분을 두고 뭐가 예쁘다는 거냐고 중얼거린다. 결국 그가 찍은 사진은 꽃을 보고 있는 그녀다. 사진 속에서 그녀와 바이올렛은 하나가 된다. 그는 그녀가 아름답다는 것을 세상에서 처음으로 알아차린 유일한 남자다.

그녀가 살던 은행나무 내려다 보이는 기다란 이층집
“당신 사진 받고 싶으면 여기로 연락해요.”
(중략)
당신. 그녀는 자신을 두고 서슴없이 ‘당신’이라고 지칭하는 사진기자를 한번 쳐다볼 뿐이다. 바이올렛을 다 찍고 카메라 가방에 카메라를 집어넣던 그 남자는 가방 구석에 끼여 걸리적거리는 잡지를 꺼내 버리듯이 화원 안의 철제 책상 위에 던진다. 반으로 접혀있던 잡지는 내팽개쳐지면서 바로 펴진다.
- p. 122~123
미술관 앞
주인공 오산이는 남자의 사무실이 건너다보이는 미술관 앞 빈터에 예민하고 연약한 바이올렛을 심는다. 날마다 빈터에 하염없이 서 있다가 화원으로 돌아오곤 한다. 그녀가 용기를 내어 남자에게 전화하지만 끝까지 남자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다. 알아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산이’를 처음 아는 채 했던 남자는 슬프게도 그를 찾아간 ‘오산이’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녀는 땅을 깊게 파먹은 포크레인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놓아버린다.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뽑히고 헐리는 식물들처럼 주인공도 광화문 언저리에 뿌리를 내리려 했으나 거대한 힘을 가진 기계에 뽑혀나간다.
포크레인이 그녀의 빈터 앞에 서 있다. 천천히 포크레인을 향해 걷는 그녀. 그 사이 포크레인은 땅을 많이도 헤쳐 놓았다. 퍼올려진 흙더미들이 여기저기 수북하게 쌓여있다. 깊숙이 땅을 파헤친 포크레인이 그녀가 일구어 놓은 꽃밭 자리에 포만한 짐승처럼 서 있다. 그녀가 얼른 포크레인 밑의 땅바닥을 내려다본다. 바이올렛들은 흔적이 없다. 그녀가 한 포기 한 포기 심어 둥근 원을 만들어놓은 바이올렛은 단숨에 포크레인에 뒤집혀 사라져버렸다. 그녀가 아아-악, 단말마의 비명을 내지른다.
- p. 272
나는 딸이 여섯이나 되는 집안에 다섯째 딸로 태어났다. 소설을 읽으면서 수없이 긴 호흡을 하거나 낯익은 기억 저편을 서성이다 돌아오곤 했다. 나의 한숨 소리가 소설 속 그녀들에게 전해졌을까. 소설 『바이올렛』은 뿌리 깊은 차별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온몸으로 꾹꾹 써 내려가던 ‘오산이’의 기록이며 우리 모두의 자서전이다. 눈에 띄지 않고 요란스럽지도 않지만 해마다 바이올렛은 피어날 것이다. 풀씨처럼 덧없이 세월의 강을 건너간 그녀들이 부디 봄마다 우리들 곁에 새로 부활하기를 바랄 따름이다.
어머니, 어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어머니들이여!


